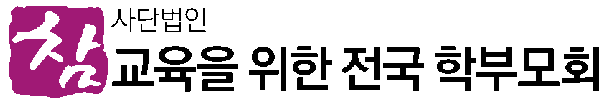교육공공성 | 305호 더불어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7-04-06 16:06 조회919회 댓글0건본문
더불어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회복적 생활교육’
우리 학교는 인천 북항 부근에 자리
잡은 작은 학교다. 한 때는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였지만, 갈수록 학생
이 줄어 현재는 15개 학급, 340여 명이다. 수출품을 실은 대형 화물차들
이 오가는 대로를 지나야 하는 위험
부담과 남자 중학교라는 편견 때문인
지 학생도 교사도 선호하지 않는 학교
였다. 그런데 2011년 ‘모두가 행복한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으로
김태용 교장 선생님이, 2012년 세 명의 교사가 자원하여 학교에 전입해
온다. 학교를 섬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이분들은 1년간 가정방문,
학급야영, 학부모 편지 보내기, 1:1 결
연 등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역할을 감당한다. 2013
년, 학교문화 변화를 위해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담임은
담임 역할만, 나머지 소수 인원이 모든 행정업무를 나눠 맡아 1인이 3~5
인 역할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모두 동의해 주었고 가장 많은 역할을 세 교사가 맡는다.
교사들은 생활지도 차원으로 실시
하던 상벌점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오랜 논의 끝에
관계만 악화되고 행동변화의 한계가
있는 상벌점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
정한다.
그러나 대안이 없어 당시 ‘좋은교사
운동’에서 시작하고 있던 ‘회복적 생
활교육’을 가져오게 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동의로 시작한 대안
이었지만, 첫해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교사연수가 학기별로 실시되고
학부모연수, 학생이해교육이 실시 되었지만 자발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이
그저 막연하게 허용되는 태도로 오인
되었고, 상호존중을 중시하는 철학이
존중만 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학생의 모습을 낳기도 했다.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회복적 대화모임(RC)은 외부
전문가가 진행했는데, 이해가 부족해
효과가 작아 보였다. 모두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서클회의로 학생자치회의가
바뀌었지만, 때로 무질서해 보였다.
급기야 구성원들은 회복적 생활교육
의 효과에 대해 회의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기별 평가회 때마다
관계 속에서 존중감을 찾아가고 공동체 세우기의 중요성이 다시 상기되면서 조금씩 깊이 있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인간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기본으로 한다. 첫째,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 둘째, 모든 인간은 상호의존적 존재다. 셋째, 모든 인간은 내면의 지혜를 지녔다. 위 세 가지는 살아남기 위한 경쟁과 잘못된
성공의 신화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념이다. 회복적 생활교육 5년차
를 맞이하는 우리 학교는 잃어버린 것
을 회복하는 희망을 경험하고 있다.
교사문화는 서클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모두가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자신의 목소리가 충분히 존중됨을 알고 또 그렇게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자치회의는 자발적이다.
학교나 교사가 강요하거나 이미 짜
놓은 무대에 오르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자신들의 무대를 만들고 자신들의 춤을 만들려는 참여가 갈수록 늘
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익숙한 결정방식이 이제는 소수의 의견을 환대하고
그 속에 숨겨진 지혜를 발견하려는
합의의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교실에서는 강한 척, 착한 척하지
않아도 자신이 수용되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탐색
하고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생기 있는 것인지, 위에 서려는 것보다 동등하게 모두를 대하는 것이 안전한 관계 맺기의 시작임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최근 우리는 ‘자발적 책임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잘못의 대가를 제3자가
결정해서 치르게 하는 응보적 정의에
서는 책임을 배우기 어렵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대가를 원하지 않는 방식
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한다. 현재 이 사회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회복적
정의 시스템 속에서는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법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사건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두가 조금씩
책임을 나누고 당사자들의 관계회복
을 위해 참여하기 때문이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은 크든 작든 모두 나와 관계되어 있다고
믿는다. 너의 일, 당신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 내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나 부모가, 이 사회가 이
것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과정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사
들은 이것을 살아내기 위한 성찰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문화가 이 사회의 흐름이 되기를. 잃어버린 존중과 책임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아내는 사회가 되기를. 회복된 사회를 보고 자라나 는 아이들이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관계 속에서 함께함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이미 지니고 있는 내면의 지혜를 듣고 반응하는 행복을 살아내기를.
김은영 (신흥중 교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